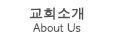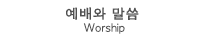쥐가 들어온줄 알았습니다.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에 전념하느라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부시럭소리로 방해받곤 했습니다. 마음에 작정하고 부시럭 소리의 정체를 밝힙니다. 그런데 그 소리를 지어내는 것은 쥐서방이 아닌 새였습니다. 바알간 페인트를 온몸에 칠한듯 붉은 빛 새가 교회 뒤편 유리벽에 끊임없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소리였습니다.
한겨울이 지나고 찬서리가 물러가는 때엔 어김없이 봄의 소식을 알리던 내가 좋아하던 바로 그 새입니다. 그동안 나무 꼭대기 잔가지 끝에 메달려 있어 멀리만 보이던 그 녀석을 이제는 유리벽 한장을 사이에 두고 가까이서 보고 있는것입니다. 생각만큼 예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그 색상의 화려함은 예전이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.
한두번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벌써 일주일이 넘도록 저렇게 끊임없이 예배실에 들어오려는듯 유리벽을 두드립니다. 마음같으면 그 유리문을 열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. 계속 저러다간 크게 다칠것같아 염려도 됩니다.
새가 못 들어오니 내가 밖으로 나가 보는수 밖엔 없습니다.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다시 관찰합니다. 그런데 제 눈에 보인건 다름 아닌 유리에 비친 내 모습입니다. 제가 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 녀석 눈에도 왠 낯선 수컷 새가 자기를 노려본것처럼 보인듯합니다. 유리에 비친 자신을 다른 수컷으로 생각했던지 쫓아내려고 그다지도 싸우는 모양입니다. 자신이 자신인지 모르는 자신과 싸우는 그 새가, 내 자신임에도 나를 모르고 열심히 나와 싸우고 있는 나를 닮은듯합니다.